
2011년 2월 20일, 올들어 가장 높은 기온으로 봄 날씨와 같았다.
전시회가 시작된 이후로 몇 달 동안 가보지 못한 샤갈전을 관람하러 서울시립미술관엘 갔다.
표를 사서 입구로 들어갔으나, 전시장을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선 대기자만
어림잡아 100여명이 훌쩍 넘어 보인다. 먼저 들어간 관람객이 나와야 다음 차례의 관람객을
들여보내주고 있었다. 사무실에 가서 일해야 하는데... 표를 취소하고 다시 되돌아 나왔다.
전시장의 이런 풍경은, 유럽엘 갔을 때 미술관마다 펼쳐지는 광경이었다.
루브르박물관에서는 모나리자를 보기위해 하루종일 기다려야 해 포기하였고,
오르쎄 미술관에서는 관람객이 좀 덜 있는 전시장만 둘러본 기억이 난다.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도, 피렌체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암스테르담의 반고흐미술관에서 본 수도 없이 많은 해바라기와 자화상을,
서울시립미술관의 반고흐 전시에서는 겨우 단 한편씩 밖에 볼 수 없었지만
반고흐, 마그리트, 마티스의 전시를 유럽에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은 반길 일이다.
르 꼬르뷔지에의 사보아빌라를 보기 위해 파리 교외로 기차를 타고 나가니,
사보아빌라가 위치한 곳의 버스정류장 이름이 'le corbusier'이었다.
건축가의 이름이 버스정류장이라니, 건축가가 상당히 대중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1993년에 호암갤러리에서 샤갈전이 있었다.
전시회 카다로그의 촌스러움이 세련되어진 만큼이나 18년이 지나온 사이에 문화적인 욕구가 많이 자란 듯하다.
그 당시의 전시회는 한산하기 그지 없었는데 말이다.
볼만한 전시회가 자주 열리던 호암갤러리였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서울시에 내어준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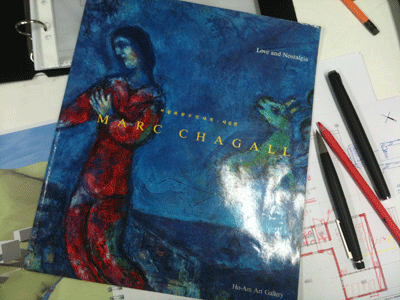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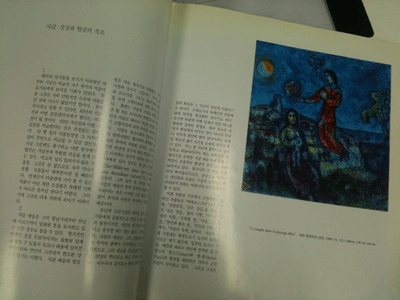
(1993년의 전시회 카다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