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막을 내린 서울건축문화제의 프로그램중에
올해 새로 생긴 코너로
<서울 아름다운 건물 찾기 공모전>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포스터를 보았을 때에도 모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무심코 지나치곤 했다.
몇달 전, 2011년에 완성한 평창동의 첫번째 주택의 건추주께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하였다.
<서울 아름다운 건물 찾기 공모전>에 당신의 집을 제출하려 하는데
모도의 의견이 어떤지와 사진작가의 저작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오신 것이다.
흔쾌히 동의를 해 드리고, 사진을 찍어주신 염승훈 작가와도 오랜만에 통화하여
저작권 동의서를 받아 건축주께 전해드리고는
몇 달이 지나,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되었다며
건축주께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신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한 주택 프로젝트인 이유로
조용히 마무리된 건물이었는데, 수년이 지난후
건축주께서 직접 이런 영광스런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다.
건축가의 이름으로 애써 발표한 것이 아니어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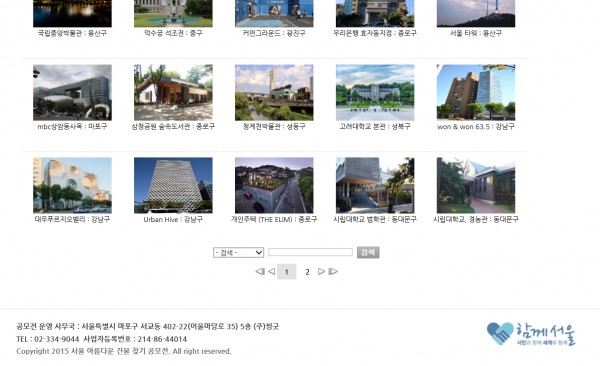
평창동 단독주택 1 THE ELIM 보러가기
/g5/bbs/board.php?bo_table=modoworks01&wr_id=31 1998년 인사동에서 흥미로운 전시가 열렸다.
<목수 김씨전>이라는 제목이 붙은 가구전시회였는데,
김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되지 않은 채
[게으름뱅이를 위한 테레비 시청용 두개골받침대]
[의자위에서 책상다리를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을 위한 의자]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등받이]
등의 정겨운 제목이 붙은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 이글을 쓰고 있는 김씨의 마음에 쏙 든 가구는
[의자위에서 책상다리를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을 위한 의자].
언젠가 꼭 장만하리라 다짐하며 보았던 기억이 선하다.
산에서 버려진 나무를 주워와 다듬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작품명과 함께 김씨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은 것.
2010년, 건축학과 1학년 학생들을 지도할 때
2학기 마지막 과제로 주택이 주어졌다.
학생 중 한 명이 목공 스튜디오와 결합된 주택을 설계하며
건축가인 아버지의 친구인 목수 김진송을 생각하며 만들었단다.
이 목수가 바로 <목수 김씨전>의 주인공이다.
자신의 이름을 무명으로 돌릴 정도의 내공이라면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목수 김씨에 관한 정보를 이미 찾아두었던
나에게는 이 학생의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수년이 지나,
조성룡도시건축의 선배가 건축에 관한 글을 한 신문에 연재하며
여러 인물을 인터뷰하는데
그 중의 한 인물 또한 목수 김진송.
남양주에 직접 지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 글 중
김재경 선생님이 촬영한 스튜디오 내부는
17년전 전시회의 여운이 묻어난다.

목수 김진송의 작업실 [사진=김재경]
2년여전 블로그를 처음 열며
'건축가 김씨'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데는
<목수 김씨전>이라는 전시회의 여운이 크게 남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술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가
우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길이라 여긴다.
우리의 작업 또한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정겨운 풍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면
작자미상으로 남는들 어떠한가.
[건축과 삶] 글 보러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92027255&code=960202